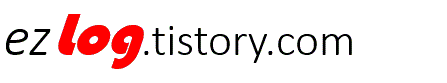오랫동안 쓰지 못하고 있다가, 무엇이든 쓰지 않을 수 없어서, 일단 대략적으로만 쓴다.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영화에서 이 대사를 듣는 순간, 바로 이 지점이 영화의 정점에 해당하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 영화는 사랑이 어떻게 인간을 붕괴시키는가에 대한 영화이고, 동시에 사랑이 어떻게 그 붕괴를 끊임없이 (그러므로 영원히) 유보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영화이다.
<아가씨>가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영화 역시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붕괴되는(사랑에 빠지는) 해준과, 붕괴가 회복되는(파도치는 바다의 혼돈 가운데에서, 더이상 구두를 신지 않은 해준이 운동화의 신발끈을 다시 묶는 그 지점의) 해준.
해준은 혼돈 속에서 비로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모든 것이 흩어지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바다 속에서 붕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영화가 불륜을 다룬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인간을 붕괴시키는 강렬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미 평온한/일상적인(즉 부부와도 같은) 사랑이라는 말과 형용모순되기 때문이다.
해준을 중심으로 한 영화의 서사 구조가 너무나 강렬했으므로, 처음에는 서래가 해준의 사랑, 붕괴, 회복을 돕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력적인 연기에 속기 쉽지만, 살인 흔적을 감추어야 한다는 목적을 지닌 그녀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던 까닭이다.
그래서 계속 드는 의문은 왜 그녀의 할아머지가 광복군으로 설정되었을까 였다. 단순히 한국에 오게 하기 위한 장치일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소 과하게 느껴졌고, 어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한 그녀의 집착이 잘 이해되지도 않았다.
"그동안 너무 무거웠어요."
왜 그녀는 그러한 '무거움'을 해준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전까지, 즉 그를 위해서 스스로 붕괴되겠다고 마음 먹기 전까지, 계속해서 간직해야만 했던 것일까.
하지만 영화를 두 번째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영화는 진정으로 해준이 아니라, 서래의 붕괴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도한 미장센을 사용하여 산과 바다를 대립적으로 상징화하는 것의 의미도.
서래의 할아버지는 산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서래의 어머니는 한국에 서래의 산이 있다고 말한다. 그 산에 관한 책과 할아버지의 유골을 품에 안고 서래는 한국을 찾는다. 즉 서래는 중국인이(한국인도) 아니다. "한국말을 잘 못해" 마침내 중국인처럼 보이는 서래에게 할아버지의 산은 궁극적인 정착지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정착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다를 좋아하는 서래는 고소공포증이 있을 뿐더러, 한국에는 등산을 즐겨하는 기도수와 같은 인간들이 산을 선점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서래는 산을 되찾기 위해, 정착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결국 그녀는 산에 무거운 짐을 버리고, 유동적이고 무의미한, 모든 것이 흩어지는 바다로 돌아간다. 붕괴되어, 영원히 해준과 헤어지지 않을 결심을 하고, 해준의 영원한 미제 사건이 되고, 결국 그렇게 해준과 헤어지지 않게 된다.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니었떤 그녀는 산과 바다에 끼인 존재론적 조건을 지녔다. 살인사건의 해결이라는 구조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목숨과도 같은 문제였을 것이다. 시체와도 같은 몸으로 밀항선을 타고 한국에 오면서도, 끝까지 산에 대한 책과 할아버지의 유골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서래가 '산'(정착)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며, 그것을 완성(정확히 말하자면 유보)하기 위해 서래는 비로소 자신이 있던 그곳, 바다로 돌아간다.
모든 것을 붕괴시키면서, 영원한 혼돈 속에서 우리를 놓아 주지 않는 그곳, 바다로. 다시 말해, 사랑 그 자체로.
* 그녀는 말한다. "헤어질 결심을 하려구요."
이는 그녀가 영원히 사랑 속에 있겠다는 말로도 들린다. 금연으로 비유하자면, 금연이란 완성될 수 없듯이, 다시 말해 금연은 담배 피는 것이 유보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므로, 그것은 담배를 피지 않을 결심이다. 헤어질 결심은 결코 헤어짐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고, 헤어짐은 완수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