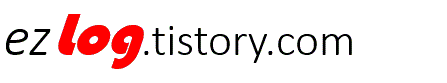컨택트(Arrival, 2017)
카테고리 없음 2017. 2. 6. 11:42 |드뇌 빌뇌브(Denis Villeneuve) 감독. 제레미 레너, 에이미 아담스.
외계인이 나타났다. 여기까지는 흔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우리는 당연히 그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영화를 본 기억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에만 집중해 왔다. 그래서일 것이다. <컨택트>의 주인공이 전쟁의 산스크리트어 어원을 '다툼'으로 보지 않은 것은. 원하는 것이 암소든 혹은 다른 것이든, 그것을 알면 전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암소를 원하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나도 더 많은 빵을 원하지만, 전쟁을 하고픈 생각은 없다. 당신 역시 그럴 것이다. 나눔으로써 더 풍요로워진다는 식상한 말이 아니라 소유의 문제는 언제나 분배의 문제를 수반한다는 뜻이고, 분할은 곧 분배(divide)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전쟁이 아니라 나눔에서 시작되므로, 이 영화가 이제 언어 자체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특히나 이 영화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언어결정론을 전제한다. 언어결정론은 그다지 신뢰할 바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라는 명제 자체는 무한히 신뢰할 만하므로 그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형성에서 벗어난 외계인의 표음문자, 시제가 없으며, 특히 '원'으로 이루어지는 그 순환적 문자를 배우면 미래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영화적 상상력은 무척 흥미로운 것이다.
시간의 흐름이 무의미해지는 이러한 순환성은 영화라는 독특한 재현장치와 만나 흥미로운 반전을 이룬다. 딸을 잃은 이후의 루이스가 훨씬 늙었을텐데, 영화에서는 딸을 낳기도 훨씬 전, 외계인을 만난 루이스의 모습이 더 피곤해보이게 만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낚시질 치고는 다소 치사한 셈인데, 재미있는 낚시질이었으므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아니, 서사의 시간을 뒤섞어놓는 이러한 기법은 가히 <메멘토>와 비교될 만하다고 생각되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영화 <컨택트>는 원작 소설 <네 인생의 이야기>의 서사전략을 훌쩍 뛰어넘어, 영화로서의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
딸을 잃은 어머니의 문제는 영화의 핵심적인 감정선에 해당될텐데, 단순히 반전의 소재로만 이용된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은데, 남편이 무심히 묻는 한 마디, "아이를 갖고 싶어?"에 주인공은 반드시 대답해야만 하는 까닭이다. <오이디푸스 왕>의 모든 인물들은 미리 예언된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피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는데, 이 평범한 주인공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그 고통을 감당하고, 담담히 감내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녀는 결국 아이를 낳고, 매 순간 아이의 죽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운명에 대한 이 초월적 숭고함을 영화는 잘 담아내지 못한 것 같다.
한편, 매우 불편했던 것은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라는 점이었다. 테드 창 원작 소설에서 국제정치의 맥락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것은 헐리우드의 저열한 책략임이 분명하다. 끝까지 대화를 시도하는 '미국인 언어학자'와 당장 무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중국 지도자 '샹'의 대비는 다소 촌스러웠고, 어떤 점에서는 조금 불쾌했다. '표음' 문자이면서 시제가 없는 문자인 '한자'의 존재를 영화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촌스러움은 불쾌로 바뀌었던 것 같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소통의 윤리가 핵심인 영화로서 취할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영화적 흥미로움이 그런 불편함을 계속 가려주어서 더욱 난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