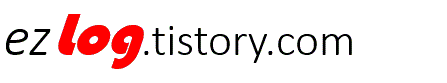<82년생 김지영>, 조남주, 민음사, 2016.
전성욱은 "정치적 긴급함이 전술의 안이함에 대한 변명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지만, 중요한 것은 '안이함'에 있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정말 유용한 '전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작가도 아마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사실 '전술'을 논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목적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우리 사이에 이 '목적'에 대한 합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같은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은 다양할 수 있으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떠한 게임도 따라오지 못할 거대한 오픈월드다. 누가 섣불리 '전술'을, '목적'을 말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는 안이함이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 그는 "여성의 삶을 그렇게 사회적인 통념으로 상투화하는 것"이 '반여성적'이라고 말하지만, 이 책은(작가는, 출판사는) <상투화>를 통해 매우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동시에 누군가는 충분한 싸움의 동력을 얻었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소설의 통계(와 각주)에서 확인된다. 이 책의 상투성은 플롯이 아니라, 통계에서 나온다. 작가는 철저하게 '통계'에 의해 플롯을 구성해나간다.
다시 말하자면 이 책은 미적으로 형상화하거나, 혹은 남들을(남자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책은 '소설'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이해'나 '타협'은 더군다나 아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어색한/불편한 것은 바로 그 통계(와 각주)였지만, 어차피 이 소설은 '소설'을 목표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소설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 목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무수한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생략해도 좋다.
마지막으로 굳이 '소설'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이 소설은 아마추어리즘을 보여주며, 동시에 아마추어리즘이야말로 소설이, 왜 소설인지 보여준다.
다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